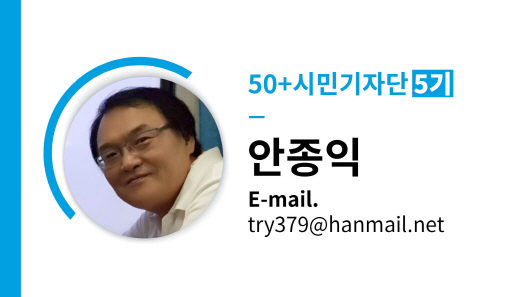지금도 청년? 아니고 가을!
한때 유행처럼 여러 강의에서 들은 기억이 있고 그것을 사진 찍어 여기저기 퍼 나른 적도 있었다. ‘우리 나이가 아직 청년.’ 그런데 어느 틈에 슬쩍 사라졌다.
그때 많은 강사들이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기준이라면서 0세부터 17세를 미성년자, 18~65세를 청년, 66~79세를 중년, 80~9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별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UN에서 발표한 자료이고 수명이 많이 늘다 보니 팔팔한 청년은 아니지만, 기분은 괜찮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뉴스에서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고 UN에서는 아직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 이걸 좀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50플러스를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어서였고 별로 설득력도 없어 보였는데 팩트를 알게 된 셈이고, 이제는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나 아직 우리가 청년이니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자고 기운 북돋울 때 써먹는 파이팅의 구호로 남은 셈이 되었다. 지천명(知天命)과 이순(耳順)의 나이에 청년이라 외치면 공자님도 “듣기는 좋다만” 하고 웃음 한번 날렸을 터이다.

▲ 오래전 책 사이에 꽂아둔 단풍잎의 추억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 어느 대학 캠퍼스의 가을이 깊다.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50플러스와 가을
그럼 가을은 어떤가? 해마다 맞는 계절이지만 가을의 느낌은 언제나 좋다. 우리 50플러스 이후 세대에 참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니 분석하고 따질 생각은 하지 마시라. 느낌은 자유 각각이니.
만약 인생을 사계로 나눈다면 (수명이 길어진 것을 감안한다) 0세에서 29세는 봄, 30세에서 49세는 여름, 50세에서 74세는 가을, 75세에서 90세는 겨울로 구분한다면 어떤가? 물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필자의 독단적, 심리적 연령 구분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충 넘어가시라. 얘기하고 싶은 건 가을이란 계절이다. 조금 기대해보는 건 50대가 되면 대개 가을의 묘하고 델리케이트한 느낌을 사랑할 거라는 거와 여기에 동의를 해줄 사람이 제법 있을 거라는 거다. 그 확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또 따지냐? (크크) 내가 아는 주위의 많은 이들이 그렇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
여하튼 난 가을을 좋아한다. 좀 더 나아가 사랑한다. 왜냐고? 이유를 말하라고?
특별하게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가을이 주는 약간의 쓸쓸함, 우수에 젖음, 촉촉이 젖은 영화의 화면 같은 느낌, 그리고 지난 것에 대한 그리움, 사색의 분위기, 성숙함, 무언가 하나 나와 줄 거 같은 그 무엇(에트바스: etwas), 그런 것들이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소 무르익어 나오는 여유로움도 있는 것 같다. 미세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하향할 거라는 변화에 대한 인정, 담담함,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슬프지는 않다. 그런 다소 우울한 감정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을인 듯싶다.
그런데 말이다. 난 젊은 시절에도 가을의 느낌을 좋아했던 것 같다. 젊은 시절 가을의 기억을 소환한다. 필자가 글을 쓰는 이 시간은 어두운 밤이고 가을밤 산책 후의 어정쩡한 감성이 남아있는 시각임을 이해하라.

▲ 단풍에 물든 내장산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 단풍 참 곱다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기억 하나,
대학 교양 국문학개론 시간에 장르 불문의 글을 쓰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필자는 ‘가을 편지’를 소재로 수필류의 글을 쓴 기억이 있다.
캠퍼스가 가을의 빛깔로 가득하던 때였다.
고은의 시구절인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도 글 속에 들어간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글이었을 것 같다. 그 수업의 교수님은 한 이름 알려진 분이셨는데 글 평을 하면서 남학생이 쓴 글 중 모처럼 감성 짙은 글을 만났다고 했다. 좀 야들야들한 느낌이 들었던 건 분명했던 것 같다.
그날 교수님은 한술 더 떴다. 아마 가을의 센티함이 교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도 있다.
“안군의 가을 편지를 받고 싶은 모르는 여인이 되고 싶은 여학생은 손들어 보시오?” 용감한 몇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다음은 얘기 안 하겠다. 낭만 가득했던 가을 기억의 하나다.
기억 둘,
가을이 되면 이 노래가 떠오른다.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라는 곡인데 이 무렵 가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실 때 들을 수 있는 곡이기도 하다.
필자의 대학 시절 조동진이 부른 이 곡은 당시 꽤나 불렸고 나도 많이 흥얼거렸다. 이 무렵 데이트하던 후배가 이 노래를 자주 불러 달라해서 단풍 짙게 물든 남산 길을 걸으며 한껏 분위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다. 참 오래전의 이야기다. 남산 산책 후 명동으로 내려오면 ‘필하모니’라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비제, 모차르트, 베토벤, 바그너, 차이콥스키, 바흐를 만났었다. 폼 잡고 아는 체를 하던 치기 어린 시절이었다. 가을의 남산 길은 지금도 그래서 더 정겹다.
“그 후배가 지금 함께 계신 그 분인가요” 하고 굳이 물으면 그냥 씨익 웃을 밖에. 가을은 지난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어서 좋다.

▲ 더 이상 붉을 수가 없다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 단풍터널 사이로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내장산의 가을 단풍
느긋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오랜만의 버스 여행이었고 남녘이 한창 단풍 절정기여서 가다 오다 시간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도로의 막힘쯤은 그냥 미소 지으며 넘기기로 했다. 차창 밖의 풍경도 온통 가을이 아닌가? 리무진버스에서 느긋하게 가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 년쯤 만에 가보는 가을 단풍의 진수라 하는 내장산과 백양사의 나들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주 다행히 몇 차례의 서행을 제외하곤 도로는 그리 막히지 않았다. 다만 내장산의 입구에서부터 차는 거의 정체의 상태가 되었다. 차량 탑승한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날 지점을 정한 후 차에서 내려 걷기를 택하였다. 많은 분들도 의견을 같이해서 아마 반 이상의 승객들이 단풍길을 걷는 것으로 하차하였다. 내려서 걷는 가을 길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신의 한 수’였다.
아! 내장산의 가을 단풍은 아직 살아 있었다.
올가을 단풍의 빛은 예년만 못하다는 말이 들렸는데 내장산의 단풍은 여전했다. 내장사로 걷는 길의 단풍터널과 가을 색감, 그리고 빛을 담아내기 위한 셔터 누르기로 마음이 분주했다.
내장산의 귀한 단풍 모습은 사진으로 대신한다.

▲ 청춘들의 단풍놀이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 내장사 입구 연못의 단풍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가을은 50플러스 세대와 닮았다
필자는 글 모두에 인생을 사계로 나눈다면 50세에서 74세(가을만 좀 긴가? 이건 순전히 내 욕심이 들어 있다.)까지를 가을이 아닐까 하고 편하게 분류하였다. 개인 별로 생각은 상이하겠지만 가을은 무르익은 계절이다. 피어나는 봄과 불타오르는 여름을 지나 가을은 열매를 맺고 맺은 열매를 나누어 주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단풍은 그러한 고마움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연이 주는 선물인 듯싶다. 물론 이는 필자의 감성적 접근이다.
과학적으로는 단풍은 수목의 내한성(추위를 견뎌내기 위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고 나뭇잎의 영양소가 가지나 줄기로 이동하면서 엽록소가 파괴되어 잎의 색깔이 변화되는 결과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50플러스 세대는 가을과 닮아있다.
경우는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한 사이클의 시기를 지내왔고 대부분 인생 이모작의 시기를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시기이다. 나름대로 한 분야나 공간에서 어느 정도 소임을 마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거나 또 한 번의 선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 과정과 역경의 시간을 돌아보고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걸어갈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만 했던 지난 시간을 정리하며 서두르지 않고 걸을 길을 정해 보는 것이다.
하여 가을의 단풍처럼 곱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자신의 빛깔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여유롭게 겨울의 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것이다.
“50플러스여! 이제 바삐 서두르지 마라.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이다.

▲ 붉은 단풍과 감나무의 조화로움 ⓒ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친구가 묻는다. “왜 그렇게 바쁜 거야? 뭐 한다고.”
내가 말한다. “가을 아니냐? 내가 가을 느끼느라 좀 바쁘다.”
음악이 들려온다. ‘알 수 없는 인생’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지금은 가을이 깊다. 그러니 가을이 지나면 그때 물어보자.
그리고 말이다. 솔직히 가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50+시민기자단 안종익 기자 (try379@hanmail.net)